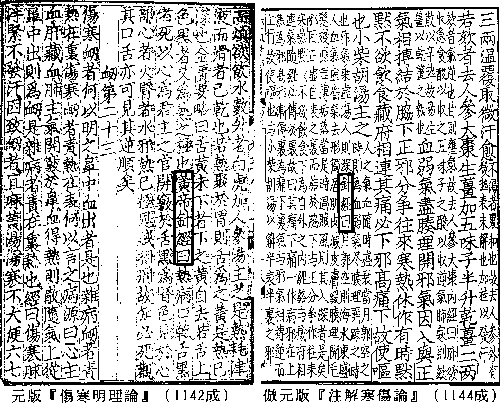 『靈樞』:明代 無名氏가 宋本을 토대로 영인한
판본[14].
『靈樞』:明代 無名氏가 宋本을 토대로 영인한
판본[14].
지금의 영추는 고려정부에서 소장하고
있던 침경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The "Lingshu" originated in the
"Zhenjing" owned by the Koryo Government
1 서언
현재 사용되고 있는『黃帝內經靈樞』(以下 『靈樞』)의 옛 이름은 『鍼經』이라고 여겨진다[1][2]. 『鍼經』은 중국에서 1세기경에 이전의 자료를 토대로 편찬된 서적이라 여겨진다[3]. 그러나『靈樞』라는 이름은 『黃帝內經素問』(이하『素問』)의 王 의 주석(762년)에 인용된 것이 처음으로 그전의 기록은 없다[4]. 더욱이 역대의 기록을 보면 220년경에 『九卷』[5], 280년경에 『鍼經九卷』[6], 656년에『黃帝鍼經九卷』[7], 875-891년경에『黃帝鍼經九』[8], 945년과 1060년에 『黃帝鍼經十卷, 黃帝九靈經十二卷靈寶注』[9][10] , 1068년에『九墟』[11] 라는 책에 이에 대한 기록이 있어 이들과 왕빙의 주석을 인용한『靈樞』와는 같은 계통의 서적이라고 1068년 新校正注에서는 보고 있다.[12]. 단 王應麟(1223-96)이 괇汾窩 제1편은 九鍼十二原, 靈樞의 제 1편은 精氣[13]라고 기록하고 있어 13세기 후반에는 두 서적이 다른 종류의 서적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금의 『靈樞』는「九鍼十二原』을 제 1편으로 하고 있으며, 왕응린이 말하고 있는『靈樞』가 아닌『鍼經』과 일치한다.
현재의『靈樞』24권은 남송의 史崧이 1155년에 서문을 달아 간행하였고[14], 이후에 널리 알려졌다. 사숭은 겵煊 소장하고 있던 舊本 『靈樞』九卷을 二十四卷으로 다시 출판한다.궣箚磁 하였고 왕빙이 인용한『靈樞』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와 그 유래를 알수 있는 내용은 일체 기술하지 않았다.
한편 11세기에는 아래와 같이『鍼經』에 관한 기록이 있다. 北宋 정부가 고려사절의 李資義 등에게 헌상을 요구한 서적의 목록이 『高麗史』10권 1091년6월18일자 기록에 나와있다.[15]. 그 요구된 목록 중에 『黃帝鍼經九卷』과 『九墟經九卷』이 있다. 이 요청에 의하여 고려의 사신 黃宗懿가 1092년11월에『黃帝鍼經九卷』을 북송정부에 바쳤고[16][17], 1093년1월23일에 북송의 國士監에서 간행되었다.[18][19][20].
이러한 기록에 의거해서 지금의 『靈樞』는 고려본『鍼經』에서 유래되었다고 추정하는 설이 많다. 그러나『鍼經』의 고려본도 북송에서 다시 간행한 책도 현존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鍼經』은 북송에서 실제로 간행되었는지의 여부와 고려본과 북송간본『鍼經』, 그리고 지금의 『靈樞』의 관계도 확증되지 않아 여러 설이 나돌고 있는 상태이다.[21][22][23][24][25].
그런데 1093년에『鍼經』이 국사감에서 간행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북송의 수도 즉 開封에서 였다. 개봉은 후에 금나라 그리고 몽고에
점령되었다. 그래서 宋朝는 남쪽으로 천도하여 南宋이 되었고 이 남송시대 1155년에
史崧이『靈樞』를 간행하였다. 그러면 남송과 떨어져 있던 금 또는 몽고였다면
북송에서 간행되었다고 하는『鍼經』이 사용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금과
몽고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鍼經』의 인용문이 다수 발견되었으며『鍼經』과『靈樞』에
관한 의문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2 조사문헌
본 조사 검토에는『鍼經』의 引用文과 對應文이 있는 이하의 善本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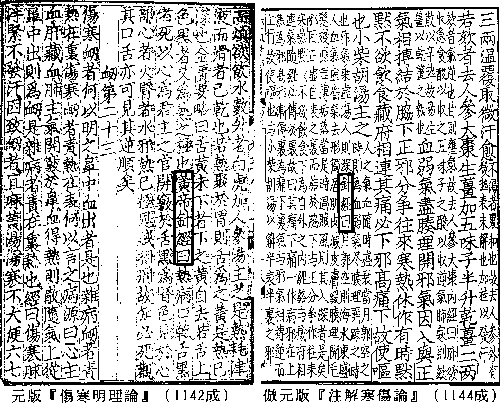 『靈樞』:明代 無名氏가 宋本을 토대로 영인한
판본[14].
『靈樞』:明代 無名氏가 宋本을 토대로 영인한
판본[14].
成無己『傷寒明理論』:元版의 Micro 필름[26].
成無己『注解傷寒論』:江戶醫學館에서 元版을 토대로 영인한 판본(1835)[27].
劉河間『宣明論方』:江戶版(1740)의 영인본 [28].
李東垣『內外傷辨惑論』:熊氏梅隱堂本(1508)『東垣十書』에 수록된 판본의 마이크로 필름[29].
李東垣『脾胃論』:上同.
李東垣『蘭室秘藏』: 上同
王好古『此事難知』: 上同.
李東垣『東垣試效方』:明版의 영인본[30].
3 조사결과와 고찰
3-1 『傷寒明理論』과『注解傷寒論』의 인용문
금나라 成無己의『상한명리론』(이하 『明理』)은 1142년, 『注解傷寒論』(이하 『注解』)은1144년에 저술되었다.[31] 『鍼經』의 인용은 위의 그림과 같이 전자에서 8군데 , 후자에서는 30군데가 있었다. 그 『鍼經』의 인용문과 현재의『靈樞』와의 대응 관계를 표1로 제시한다. 또한 이 표에서는 인용문의 부위를 卷次와 葉次) 역자주 : 葉은 古書에서 한 장을 의미한다.
로 그리고 앞 (a)과 뒤(b)행수로 표시하여 1-1a-1이면 인용문의 冒頭가 제1권, 제1엽, 表) 역자주 : 表는 고서의 한 葉, 즉 한 장에서 앞페이지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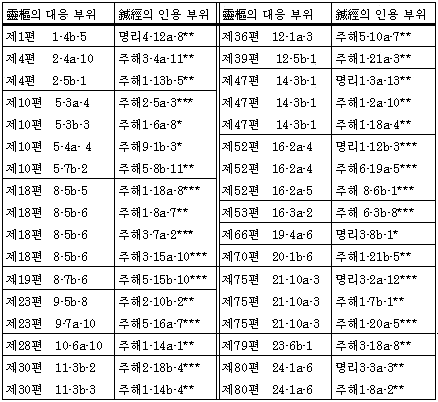 제1행 째에 있는 것을 표시한다. 또한『鍼經』인용문과 현재의『靈樞』문의
대응관계는*의 수로 구별한다. 완전하게 동일한 문장은***, 거의 동일한
문장은**, 동일한 내용의 문은 *로 나타낸다. 단『明理』의 2-4b-4와4-18a-4,『注解』의
1-10a-10와3-15a-9의 『鍼經』문은 현재의『靈樞』에서 대응문을 발견할 수
없었다.
제1행 째에 있는 것을 표시한다. 또한『鍼經』인용문과 현재의『靈樞』문의
대응관계는*의 수로 구별한다. 완전하게 동일한 문장은***, 거의 동일한
문장은**, 동일한 내용의 문은 *로 나타낸다. 단『明理』의 2-4b-4와4-18a-4,『注解』의
1-10a-10와3-15a-9의 『鍼經』문은 현재의『靈樞』에서 대응문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이『明理』『注解』에서 『鍼經』의 인용문은 현재의『靈樞』81편중 18편의 문장과 대응하고 있다. 『靈樞』와 완전히 문장이 같은 것이13개, 문장의 조금 다른 것이18개, 어구는 다르나 의미가 같은 문장이3개, 대응을 발견할 수 없는 문장이4개 였다. 한편『素問』의 주에서 인용한 『鍼經』과『靈樞』와 대응하는 문장은 전혀 없었다.
즉『明理』『注解』는『素問』을 간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鍼經』을 인용하고 있으며, 그『鍼經』은 현재의『靈樞』와 상당히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金元代 의서의 인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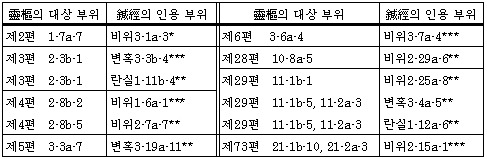 『鍼經』의
인용문이 있는 금원대 의서에 관해서도 현재의『靈樞』와의 대응 관계를 조사
검토하였다. 각 서적의 저술 년대는 劉河間의『宣明論』(이하 『宣明』)이
1173년[32], 李東垣의 『內外傷辨惑論』(이하 『辨惑』)이 1247년[33], 『脾胃論』(이하
『비위』)이 1249년[33], 『蘭室秘藏』(이하 『蘭室』)이 1251년[33], 王好古의
『此事難知』(이하 『此事』)가 1248년[34]이다. 이 5권 중에서 총16개의『鍼經』인용문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인용문과 현재의『靈樞』와의 대응관계를 표2로 나타냈다.
또한『宣明』의 2-8a-4,『辨惑』의1-2a-4,『此事』의3-6a-2,『脾胃』의1-8a-10에서
인용되는『鍼經』문은 현재의『靈樞』에서 대응문을 발견할 수 없었다.
『鍼經』의
인용문이 있는 금원대 의서에 관해서도 현재의『靈樞』와의 대응 관계를 조사
검토하였다. 각 서적의 저술 년대는 劉河間의『宣明論』(이하 『宣明』)이
1173년[32], 李東垣의 『內外傷辨惑論』(이하 『辨惑』)이 1247년[33], 『脾胃論』(이하
『비위』)이 1249년[33], 『蘭室秘藏』(이하 『蘭室』)이 1251년[33], 王好古의
『此事難知』(이하 『此事』)가 1248년[34]이다. 이 5권 중에서 총16개의『鍼經』인용문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인용문과 현재의『靈樞』와의 대응관계를 표2로 나타냈다.
또한『宣明』의 2-8a-4,『辨惑』의1-2a-4,『此事』의3-6a-2,『脾胃』의1-8a-10에서
인용되는『鍼經』문은 현재의『靈樞』에서 대응문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상의 12인용문은 현재의『靈樞』와 완전하게 문장이 같은 것이4개, 조금 다른 문장이 7개, 어구는 다르나 의미가 같은 문장이 1개였다. 그러나 어떤 문장도『靈樞』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소문』의 주를 인용한『鍼經』『靈樞』와 일치 내지는 의미가 같은 문장은 없었다. 즉 이러한 결과로부터도 금원대에 사용된 『鍼經』은 현재『靈樞』와 상당히 비슷했었단 것을 알 수 있다.
3-3 蒙古代 『東垣試效方』의 인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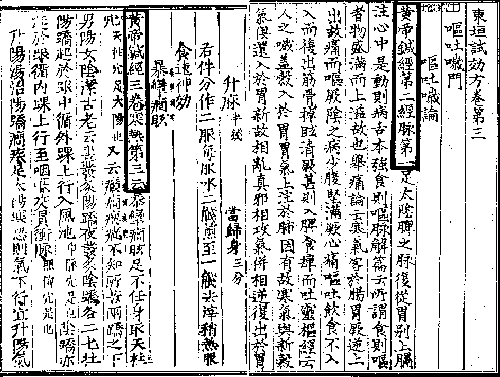 이동원의 만년 제자 羅天益은 몽고의 軍醫로 징용되어 후에 원나라의 太醫가
되어, 스승인 이동원의 책을 간행하였고, 이에 이동원의 저서가 후대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더욱이 그는 1266년에 스승의 유고를 모아 『東垣試效方』을
간행하였다. [33]. 이 서적에서는『(黃帝)鍼經』을 인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림과 같이 어떤 책의 어떤 편에서 인용한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이동원의 만년 제자 羅天益은 몽고의 軍醫로 징용되어 후에 원나라의 太醫가
되어, 스승인 이동원의 책을 간행하였고, 이에 이동원의 저서가 후대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더욱이 그는 1266년에 스승의 유고를 모아 『東垣試效方』을
간행하였다. [33]. 이 서적에서는『(黃帝)鍼經』을 인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림과 같이 어떤 책의 어떤 편에서 인용한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인용문에 기술되어 있는『鍼經』의 卷次와 篇名 및 編次와 현재의『靈樞』와의 대응 상태를 순서대로 표3에 정리하였다. 또한 이 표에서는 인용문의 冒頭가 영인본『동원시효방』의 133Page 제8행에 있으면 133-8이라고 표시하였고 인용문에서 생략된 문자는 ( )안에 보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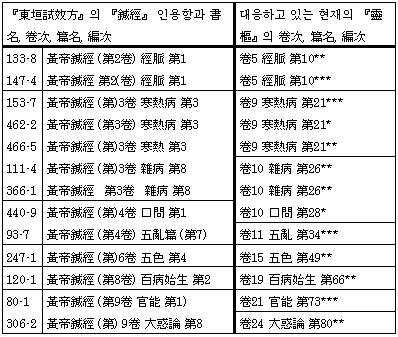 표3에서『東垣試效方』에 인용된 것은 九卷의『黃帝鍼經』이고 각 권마다 1부터9의
순서로 편차를 기입하고 합계9×9의 81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남송의 史崧刊本을 저본으로 한 지금의 『靈樞』는 24권으로
편의 순서를1부터81까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서적의 편차의 순서 및
편명은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다. 또한 문장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 즉, 『東垣試效方』에
인용된『鍼經』은 九卷짜리로 되었다는 점만 빼면 현재의 『靈樞』와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표3에서『東垣試效方』에 인용된 것은 九卷의『黃帝鍼經』이고 각 권마다 1부터9의
순서로 편차를 기입하고 합계9×9의 81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남송의 史崧刊本을 저본으로 한 지금의 『靈樞』는 24권으로
편의 순서를1부터81까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서적의 편차의 순서 및
편명은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다. 또한 문장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 즉, 『東垣試效方』에
인용된『鍼經』은 九卷짜리로 되었다는 점만 빼면 현재의 『靈樞』와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4 전체 고찰
이상과 같이 금원대의 의서에서는『鍼經』의 인용문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은『素問』의 주에 있는『鍼經』과『靈樞』의 인용문과 거의 대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 다른『鍼經』에서 인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금원대의 의서에 있는『鍼經』의 인용문은 현재의『靈樞』와 높은 확률로 일치한다. 즉 금원대에 유행했던 『鍼經』은 현재의『靈樞』와 상당히 가까웠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東垣試效方』이 인용하고 있는 『鍼經』은 九卷짜리로 되어있다는 것을 빼면 24권의 현재의『靈樞』와 편명 및 순서까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이상의 고찰로부터 알 수 있었던『鍼經』및『靈樞』에 관한 송 이후의 역사를 표4에 정리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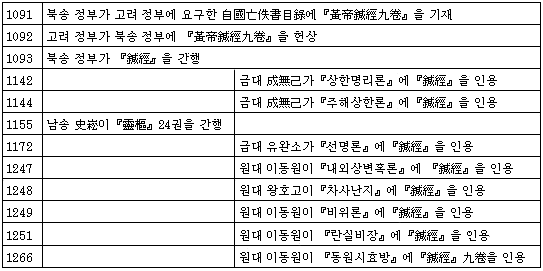 이 표에서 보듯이 남의 남송에서 현재의 『靈樞』24권이 간행된 후에도 북의
금나라와 원나라에서는 『鍼經』(九卷)이 사용되었다. 또한 금나라에서 갑자기
사용되기 시작하여 후에 원나라때까지 유포되었다. 또한 금나라에서 최초로『鍼經』을
이용한 成無己는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의학 문헌을 인용하였지만 모두
북송 시대에 간행되었던 서적만을 사용하고 있다[35]. 이 시기는 고려본을 저본으로
한『鍼經』을 북송 정부가 간행했다고 한 1093년으로부터 약50년 후이며 史崧이『靈樞』를
처음 간행한 1155년보다 이전의 일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남의 남송에서 현재의 『靈樞』24권이 간행된 후에도 북의
금나라와 원나라에서는 『鍼經』(九卷)이 사용되었다. 또한 금나라에서 갑자기
사용되기 시작하여 후에 원나라때까지 유포되었다. 또한 금나라에서 최초로『鍼經』을
이용한 成無己는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의학 문헌을 인용하였지만 모두
북송 시대에 간행되었던 서적만을 사용하고 있다[35]. 이 시기는 고려본을 저본으로
한『鍼經』을 북송 정부가 간행했다고 한 1093년으로부터 약50년 후이며 史崧이『靈樞』를
처음 간행한 1155년보다 이전의 일이다.
그러면 고려본의『鍼經』九卷이 북송에서 실제로 간행된 것, 그리고 그것을 成無己가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일이다. 한편, 이동원과 문하의 王好古와 羅天益이『鍼經』을 이용한 시기는 1093년부터 이미 150년 이후의 일이다. 그러나 이동원의 환자 중에 元好問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며 그들의 우호관계가 두터웠다. 원호문이 서적을 담당하는 관료를 지낸 적이 있으며, 금나라 제일의 장서가였다[36]고 한다면 이동원과 그의 제자들이 북송에서 간행한 계통의『鍼經』을 사용하였다는 점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더욱이 成無己와 이동원계통의 학자들이 사용한『鍼經』이 지금『靈樞』와 편명 및 순서까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하의 것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즉 사송은 북송에서 간행한『鍼經』九卷을 토대로하여『靈樞』를 간행하였다. 그리고『鍼經』의 서명을『靈樞』로 개정한 것은 왕빙이 인용한 『靈樞』를 모방하였다. 그리고, 24권으로 개정한 것은 북송 정부에서 간행한『소문』24권을 모방하였다. 이렇게 추정하면 앞에서 서술한『玉海』의 걾빔汾烏뼈 제 1편은 九鍼十二原, 『靈樞』의 제 1편은 精氣[13] 라는 기록과 王應麟(1223-96)의 기록, 즉 13세기 후반에는 두 서적이 각각 다른 종류였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 풀린다.
즉 왕응린이 말하는『鍼經』이란 고려본을
기본으로 하는 북송에서 간행한 계통이고,『靈樞』란 왕빙이 인용한 계통의
서적이였다. 그러므로 북송판『鍼經』을 기본으로 하는 현재의『靈樞』는『구침십이원』이
제1편이고, 왕응린이 저술한『靈樞』가 아닌『鍼經』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1092년에 고려 정부가 북송 정부에 헌상한『鍼經』九卷은 1093년에 북송에서 실제로 간행되어 금원대까지 이용되고 있었다. 더욱이 史崧은 북송판『鍼經』九卷을『靈樞』24권으로 개정하였고 1155년에 간행하였고 몽고가 중국을 통일한 원나라 되면서 사송의『靈樞』가 유포되었으며 북송판『鍼經』은 사라지게 되었다.
이상으로 지금『靈樞』는 모두 史崧의 서적에서
유래하고 있으며 그 원류는 고려 정부의 서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 확증되었다.
文獻
[1]多紀元胤『醫籍考』143頁,東京·國本出版社,1933
[2]岡西爲人『中國醫書本草考』10頁,大阪·南大阪印刷センタ-,1974
[3]龍伯堅(丸山敏秋譯)『黃帝內經槪論』31頁,市川·東洋學術出版社,1985
[4]上揭文獻[1],141頁
[5]張仲景「傷寒雜病論序」,『宋板傷寒論』28頁,東京·燎原書店,1988
[6]皇甫謐「黃帝三部鍼灸甲乙經序」,『鍼灸甲乙經』2頁,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
[7]魏徵等『隋書』1042頁,北京·中華書局,1973
[8]藤原佐世『日本國見在書目錄』81頁,東京·名著刊行會,1996
[9]劉昫等『舊唐書』2047頁,北京·中華書局,1975
[10]歐陽脩等『新唐書』1565頁,北京·中華書局,1975
[11]林億等「素問新校正注」,『黃帝內經素問』22頁,臺北·國立中國醫藥硏究所,1979
[12]林億等「素問王 序新校正注」上揭文獻[11]5頁
[13]王應麟等『玉海』1239頁,臺北·臺灣華文書局,1954
[14]史崧「黃帝內經靈樞序」『素問·靈樞』211頁,東京·日本經絡學會,1992
[15]鄭麟趾等『高麗史』150頁,東京·國書刊行會,1908
[16]李燾『續資治通鑑長編』4824頁,臺北·世界書局,1983
[17]脫脫等『宋史』14048頁,北京·中華書局,1977
[18]上揭文獻[17],335頁
[19]江少虞『宋朝事實類苑』397頁,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1
[20]上揭文獻[13],1246頁
[21]餘嘉錫『四庫提要辨證』625-632頁,香港·中華書局分局,1974
[22]松木きか「北宋の醫書校訂について」『日本中國學會報』48集164-181頁,1996
[23]錢超塵「≪靈樞≫名義解詁」『黃帝內經硏究大成』9-14頁,北京·北京出版社,1997
[24]成建軍「宋金以來≪靈樞≫的版本流傳」『山東中醫藥大學學報』23卷4期210-216頁,1999
[25]錢超塵·馬志才「≪靈樞≫命名簡考」『中醫文獻雜誌』2000年增刊26-29頁,2000
[26] 臺灣國家圖書館所藏本による.
[27]小曾戶洋·眞柳誠『和刻漢籍醫書集成』第16輯所收,東京·エンンタプライズ,1992
[28] 小曾戶洋·眞柳誠『和刻漢籍醫書集成』第2輯所收,東京,エンンタプライズ,1988
[29] 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所藏本による.
[30] 李東垣『東垣試效方』,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4
[31]眞柳誠「傷寒明理論·傷寒名理藥方論解題」『和刻漢籍醫書集成』第1輯2頁,東京·エンタプライズ,1988
[32]眞柳誠「素問玄機原病式·黃帝素問宣明論解題」『和刻漢籍醫書集成』第2輯8頁,東京·エンンタプライズ,1988
[33]眞柳誠「內外傷辨惑論·脾胃論·蘭室秘藏解題」『和刻漢籍醫書集成』第6輯22-36頁,東京·エンタプライズ,1989
[34]眞柳誠「湯液本草·此事難知解題」『和刻漢籍醫書集成』第6輯37-44頁,東京·エンタプライズ,1989
[35]眞柳誠·小曾戶洋「金代の醫藥書(その1)」『現代東洋醫學』10卷3號101-107頁,1989
[36]李萬健『中國著名藏書家傳略』23頁,北京·書目文獻出版社,1986